[함민복의 시로 여는 아침]
겁나게와 잉 사이 / 이원길
전라도 구례 땅에는
비나 눈이 와도 꼭 겁나게와 잉 사이로 온다
가령 섬진강변의 마고실이나
용두리의 뒷집 할머니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겁나게 추와불고마잉!
어쩌다 리어카를 살짝만 밀어줘도, 겁나게 욕봤소잉!
강아지가 짖어도, 고놈의 새끼 겁나게 싸납소잉!
조깐 씨알이 백힐 이야글 허씨요
지난봄 잠시 다툰 일을 얘기하면서도
성님, 그라고봉께, 겁나게 세월이 흘렀구마잉!
궂은 일 좋은 일도 겁나게와 잉 사이
여름 모기 잡는 잠자리 떼가 낮게 날아도
겁나게와 잉 사이로 날고
텔레비전 인간극장을 보다가도 금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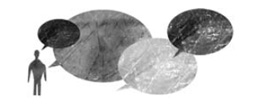
새끼들이 짜아내서 우짜까이잉! 눈물 훔치는
너무나 인간적인 과장의 어법
내 인생 마지막 문장
허공에라도 비문을 쓴다면 꼭 이렇게 쓰고 싶다
그라제, 겁나게 좋았지라잉!
이원규는 길 위의 시인이다. 그는 도보로 만 리 길을 걸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를 외치며 4대강을 따라 100여일을 걸었고, 전라도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걷기도 했다. 그는 길을 걸으며 겁 없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희생되는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고 시로 옮겼다.
'겁나게'와 '잉'에는 어떤 의미가 배여 있을까.
나는 인간이 느끼는 겁이란 감정을 존중한다. 만약 인간이 겁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 세상이라는 말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겁 때문에 인간은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를 두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것 아닐까. 겁 때문에 그나마 평화도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닐까. 겁을 안 먹고, 신성한 겁을 저버릴 때 세상사에는 문제가 생긴다. 겁을 모르는, 막돼먹은 사람을 일러 겁대가리 상실한 놈이라 비하하는 욕도 있지 않은가.
'잉'이란 종결어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소, 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싶다. 동의란 타인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겁나게'와 '잉'에는 겸손한 마음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녹아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어감만큼이나 뜻이 아름다운 이 두 말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보다 평화로워질 것이다.
부드러운 직선 / 도종환
높은 구름이 지나가는 쪽빛 하늘 아래
사뿐히 추켜세운 추녀를 보라 한다
뒷산의 너그러운 능선과 조화를 이룬
지붕의 부드러운 선을 보라 한다
어깨를 두드리며 그는 내게
이제 다시 부드러워지라 한다
몇 발짝 물러서서 흐르듯 이어지는 처마를 보며
나도 웃음으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저 유려한 곡선의 집 한 채가
곧게 다듬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
휘어지지 않는 정신들이
있어야 할 곳마다 자리 잡아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걸 본다
사철 푸른 홍송 숲에 묻혀 모나지 않게
담백하게 뒷산 품에 들어 있는 절집이

굽은 나무로 지어져 있지 않음을 본다
한 생애를 곧게 산 나무의 직선이 모여
가장 부드러운 자태로 앉아 있는
절집은 절집답네요. 직선인 기둥과 서까래의 길이 차이로 곡선을 만들며, 직선과 곡선의 경계마저 허물어 놓는군요.
법당에는 용의 머리와 꼬리가 건물의 앞과 뒤에 장식되어 있지요. 이는 법당이 용이 수호하는 배(반야용선)를 타고 피안의 세계로 가는 곳이라는 상징이라지요. 반야(지혜)의 배를 타고 바라밀(저 언덕에 이른다)에 이르려면, 경계에 집착하여 생멸이 일어나 파랑이 이는 '이 언덕'을 버려야 한다지요. 그리고 경계를 떠나, 생멸이 없어 물이 끊이지 않고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해야,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다지요. 이런 경계의 의미를 지닌 법당이니 외형의 직선과 곡선의 경계도 직선과 곡선의 합장으로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는 곧게 살면서도 부드러운 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다짐 같기도 하지요. 이 시는, 직진하는 빛이 만들어 놓는 반원의 무지개처럼 내 마음속에 오래 떠, 마음에 이는 허튼 경계 지워줄 시임에 틀림없네요.

가시 / 유종인
손바닥선인장엔
골고다 예수보다 훨씬 많은
바늘 같은 못들이 손에 박혀 있다
떨어져버리는 잎새들의 환란을
저처럼 작고 뾰족하게 벼려놓았다
잎새가 드리우던 그늘 대신
겨우 손바닥 위에
바늘 그림자 촘촘히 떠놓는다
바늘로 햇살을 떠먹는 가시 숟가락들,
사막의 식사는, 햇빛에 인색해야 한다
바늘 몇 쌈을 뒤집어쓴 손바닥 안에
바늘 허리는 뿌리처럼 숨겨두었다
햇살마저 그림자 바늘을 토한다
어떤 손길도 잘 닿지 않아
스치는 그림자마저 손잡아주지 않는구나
스스로 감옥에 갇힌 저 늙은 초록들,
바늘을 한 움큼 삼킨 사내의 목소리나
들어보고 싶구나
아니, 무수한 바늘을 품고도
仙人의 掌은 스스로
손끝 하나 긁히거나 찔리는 법이 없다
그림자조차 남기는 법 없는
궁금한 바람조차 푸른 손뼉 소리나 듣자고
신선의 손목을 건듯 흔들고 지나간다
선인장을 한자로 仙人掌(선인의 손바닥)이라 쓰는군요. 선도를 닦은 선인의 손바닥은 범인의 손바닥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 손에 가시를 박아 그림자와도 쉽게 악수 나누지 않네요. 무수한 바늘을 품고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네요. 지는 잎새들의 환란을 가시로 벼리며 마음 닦아서일까요.
사람들은, 가시눈을 뜨기도 하고, 가시 돋친 말을 하기도 하며,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가니, 선인장과 닮은 데가 있네요. 따지고 보면 선인장이란 이름 못지않게 사람들 이름도 멋지지요.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은 거창하고 건강하고 아름답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름만큼만 살아간다면 세상이 훨씬 밝아지겠지요. 그런데 제 이름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어디 쉽나요. 오죽했으면 명예롭게 죽겠다는 말이 다 생겼겠어요. 이름은 사람이란 집의 문패죠. 이름이 갖는 함축성은 놀라워, 이름에서는 푸른 손뼉 소리도 날 듯하지요.
'내가 읽은 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함민복의 시로 여는 아침] 나의 새 (0) | 2011.05.17 |
|---|---|
| 최승자, 「내게 새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0) | 2011.05.16 |
| 이덕규 <풍향계>外 (0) | 2011.05.07 |
| 천양희 <누가 말했을까요> (0) | 2011.04.13 |
| 차주일<두번째 심장> (0) | 2011.04.05 |